상세정보
두보시선 (개정판)
- 저자
- 두보 저/이종한 역주
- 출판사
- 계명대학교출판부
- 출판일
- 2017-09-29
- 등록일
- 2018-07-02
- 파일포맷
- PDF
- 파일크기
- 3MB
- 공급사
- 예스이십사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중국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과 감정이 리듬을 갖춘 응축된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개인의 서정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 반영의 소리로서 사회?정치의 교화와 관계되며, 천지와 초월적 존재까지도 감동시키는 힘을 지녔다. 당시唐詩는 이러한 중국시의 전통이 가장 아름답게 만개한 것이고, 그 정점에는 이백과 두보가 있다. 두보는 중국시의 서정적?효용적 전통을 가장 잘 대표하는 작가로, 지금으로부터 1,250~1,300여 년 전에 살면서 약 1,450여수에 달하는 주옥같은 시를 남겼다. 그는 중국시의 최고 성취를 일구어내 ‘시의 성인(詩聖)’으로 불리고, 그의 시는 시대상을 진실하고 핍진하게 그려내어 ‘시로 쓴 역사(詩史)’로 불린다. 두보 시는 약 1,2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 있는 고전이기에, 이 책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과 참된 인재상을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두 보(杜甫, 712∼770)는 중국 당대(唐代)의 시인으로 이백(李白)과 함께 중국 시단을 대표하며 우리에게도 친숙한 시인이다. 그는 본래 유가(儒家)로서 정치에 몸담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인의 길을 가게 되었다. 두보가 처한 시대는 당나라가 찬란한 번영을 구가하다가 안사의 난으로 제국의 붕괴 위기를 맞았던 때였다. 그의 생애는 크게 보아 755년에 발발한 안사의 난을 중심으로 전·후반으로 양분된다. 안사의 난 이전, 그는 당대의 다른 시인들처럼 독서와 유람으로 견문을 쌓아 착실히 벼슬에 나아갈 준비를 하였다. 735년 진사 시험의 낙제는 그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재차 유람에 나서는 한편 이백, 고적(高適) 등과 교류하기도 했다. 746년 이후 두보는 거처를 장안으로 옮겨와 고위 관리에게 벼슬을 구하는 간알시(干謁詩)를 써서 보내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생활이 10년간 지속되면서 두보는 점차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였고 당시 귀족들의 사치와 서민들의 궁핍한 삶에 대하여 절감하기 시작했다. 755년은 그에게 여러모로 특별한 해였다. 그해 10월, 그는 10년 노력의 결과로 무기의 출납을 관리하는 우위솔부주조참군(右衛率府?曹參軍)이라는 미미한 벼슬을 받고 스스로 낭패감에 휩싸였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당 왕조를 거의 멸망시킬 만큼 파급력이 대단했던 안사의 난이 발발한다. 이후 두보의 삶은 전란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며 전개된다. 두보는 잠시 장안 근처 부주에 떨어져 살던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어린 아들이 먹지 못해 요절한 사실을 알고 참담한 마음으로 장편시 『장안에서 봉선으로 가며 회포를 읊어(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를 남겼다. 벼슬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자신을 돌아보고 당시 귀족들의 사치와 서민들의 궁핍한 처지를 그렸으며 총체적인 사회의 부패상을 고발했다.
이후 두보의 삶은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다. 전란의 와중에 현종(玄宗)은 사천으로 피난 가고 숙종(肅宗)이 영무(靈武)에서 임시로 즉위한 사실을 알고 두보는 이를 경하하기 위해 영무로 가던 중 반군에 붙잡혀 장안으로 호송되어 얼마간 억류되었다. 이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봄의 전망(春望)』을 썼다. 757년 2월, 숙종이 행재소를 봉상(鳳翔)으로 옮겼을 때 두보는 위험을 무릅쓰고 장안을 탈출하여 숙종을 배알하여 그 공으로 좌습유(左拾遺) 벼슬을 받았다. 그러나 곧 반군 토벌에 실패한 방관(房琯)을 변호하다 숙종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것은 곧이어 파직으로 이어졌다. 화주사공참군(華州司功參軍)으로 좌천된 두보는 벼슬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진주(秦州)행을 감행한다. 두보의 대표적 사회시로 알려진 이른바 『삼리(三吏)』와 『삼별(三別)』이 이즈음에 지어졌다.
759년 두보는 진주에서부터 여러 지역을 전전하여 성도(成都)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두보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초당에 거처를 마련하고 나중에는 엄무(嚴武)의 추천으로 막부(幕府)에서 검교공부원외랑(檢校工部員外郞)이란 벼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으며, 엄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두보는 성도를 떠나 운안(雲安)을 거쳐 기주(夔州)에 이르게 되었다. 기주는 성도에 비해서도 더욱 낯선 곳이었지만 비교적 물산이 풍부했던 이곳에서 두보는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찾고 시가 창작에서도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이때의 대표작으로 『가을날의 흥취(秋興八首)』를 꼽을 수 있다.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풍요로웠던 과거와 일순간에 일어난 전란을 지극히 미려한 언어로 수를 놓듯이 새긴 이 시는 율시(律詩)가 이룩한 미감의 정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보는 기주 생활에 결코 안주하지 못했다. 중앙 정부에서 벼슬하리라는 희망을 끝내 놓을 수 없었기에, 768년에 협곡을 빠져나가 강릉(江陵)을 거쳐 악양(岳陽)에 이르렀다. 이후 그의 생활은 주로 선상에서 이루어졌고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악양과 담주(潭州) 사이를 전전하다 뱃길에서 사망하였다.
시인 두보가 품었던 뜻은 시종일관 정치를 바르게 펼쳐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었으나 운명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전란의 틈바구니에서 그의 삶은 자기 한 몸도 돌보기 힘들만큼 곤란해지는 때가 많았다. 시인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이 그의 꿈은 아니었으나, 역설적으로 상황이 열악해질수록 그는 더욱더 시인의 눈으로 피폐한 사람과 영락한 사물을 따뜻하게 돌아보고,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시를 썼다. 사후에 그에게 붙은 ‘시성(詩聖)’이나 ‘시사(詩史)’라는 칭호는 그의 고단하고 정직했던 삶에 대한 애도 어린 칭송이 아닐까 한다.
목차
개정판 서문 04
초판(2쇄) 서문 06
제1장 가족 사랑과 그리움
달밤(月夜) 21
105일째 되는 날 밤에 달을 마주보고(一百五日夜對月) 23
강촌(江村) 25
종무 생일(宗武生日) 27
설날 종무에게(元日示宗武) 30
아우를 생각하며 2수(憶弟二首) 32
달밤에 아우들 생각하며(月夜憶舍弟) 35
심회를 달래며(遣興) 37
아우 두관이 남전에 가서 처자를 데리고 강릉으로 온다기에 기뻐 부치며 3수(舍弟觀赴藍
田取妻子到江陵喜寄三首) 39
제2장 유람과 우정
용문의 봉선사를 유람하며(遊龍門奉先寺) 43
태산을 바라보며(望嶽) 45
연주의 성루에 올라(登?州城樓) 47
가난한 사귐의 노래(貧交行) 49
여덟 주선의 노래(飮中八仙歌) 51
이백에게(贈李白) 55
봄날에 이백을 생각하며(春日憶李白) 57
꿈에 이백을 보고 2수(夢李白二首) 59
하늘 끝에서 이백을 그리워하며(天末懷李白) 64
위처사에게(贈衛八處士) 66
손님 오심에(客至) 69
제3장 전란과 우국의 충정
앞에 요새를 나가며 9수(前出塞九首) 73
뒤에 요새를 나가며 5수(後出塞五首) 76
눈을 대하고(對雪) 79
봄날에 멀리 바라보며(春望) 81
북행(北征) 93
봄날 좌성에서 숙직하며(春宿左省) 94
진주 잡시 20수(秦州雜詩二十首) 96
이별의 한탄(恨別) 100
관군의 하남·하북 수복 소식을 듣고(聞官軍收河南河北) 102
누각에 올라(登樓) 104
가을의 감흥 8수(秋興八首) 106
다시 근심하며 12수(復愁十二首) 108
악양루에 올라(登岳陽樓) 110
제4장 민초의 고난상과 애민의 치성
진도를 슬퍼하며(悲陳陶) 115
강족 마을 3수(羌村三首) 117
신안현의 관리(新安吏) 121
동관의 관리(潼關吏) 125
석호 마을의 관리(石壕吏) 128
신혼의 이별(新婚別) 131
늘그막에 이별(垂老別) 135
집 없는 자의 이별(無家別) 139
백제성(白帝) 142
제5장 통치계층의 부패와 죄악상
다시 오랑에게 드리며(又呈吳郞) 147
전차의 노래(兵車行) 149
귀부인의 노래(麗人行) 153
도성에서 봉선현으로 가며 회포를 읊은 500자(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157
강어귀에서 슬퍼하며(哀江頭) 166
세모의 노래(歲晏行) 169
제6장 곤궁과 울분
위좌승 어른께 바친 22운(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175
취중의 노래(醉時歌) 180
아름다운 님(佳人) 184
녹나무가 비바람에 뽑히고 한 탄식(?樹爲風雨所拔歎) 187
초가집이 가을바람에 부서지고 부른 노래(茅屋爲秋風所破歌) 189
절구 2수(絶句二首) 192
제7장 우수와 고독
막부에서 숙직하며(宿府) 197
나그네 밤의 감회(旅夜書懷) 199
아무렇게나 지은 1수(漫成一首) 201
서각의 밤(閣夜) 202
높은 데 올라(登高) 204
공손대낭 제자의 칼춤을 구경하고 부른 노래(觀公孫大娘弟子舞劍器行) 206
장강과 한수에서(江漢) 210
남행(南征) 212
강남에서 이구년을 만나(江南逢李龜年) 214
제8장 인물과 물상
매 그림(畵鷹) 219
고도호 청총마의 노래(高都護?馬行) 221
미피호수의 노래(渼陂行) 223
촉한의 승상(蜀相) 227
봄밤의 단비(春夜喜雨) 229
무후의 사당(武侯廟) 231
팔진도(八陣圖) 232
오래된 편백나무의 노래(古柏行) 234
고적을 보고 읊은 감회 5수(詠懷古跡五首) 237
해설
Ⅰ. 두보의 생애와 사상 247
Ⅱ. 두보와 중국시 256
Ⅲ. 두보 시의 내용 265
Ⅳ. 두보 시의 예술 성취와 풍격 276
ⅴ. 두시 편찬과 두시언해 287
참고문헌 293
두보연보 297
찾아보기 309
역주자 약력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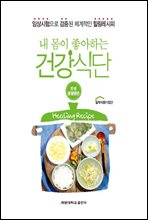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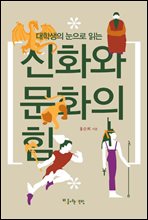

![[단독] 돈의 흐름을 읽는 연준의 생각법](/images/bookimg/yes24/526315816.jpg)


